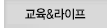미취업자 교내 인턴 단기채용 등 “부실대학 인식 땐 지원 못받아”
12일 인천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교내 취업을 통해 취업률을 높이는 게 가장 흔한 수법이다. 교내 행정인턴 등으로 단기 채용하면서 필요한 인원보다 많은 수의 미취업자를 등록하는 방법이다. 상당수 학교들이 학생과 6개월∼1년의 단기 계약을 맺고 사무보조원 등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건강보험에 가입되면 취업자로 인정하는 교육부 기준을 악용한 것이다. 이를 빼면 취업률이 10% 포인트 가량 떨어지는 대학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A대학 등 일부 학교는 1개월 미만의 단기간 고용 근로자와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직장 건강보험 적용자에서 제외하게 돼 있는데도 기업에 부탁해 건강보험에 가입시켜 취업자로 산정하는 방법을 쓰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교수가 창업한 소규모 기업에 직원으로 등록한 뒤 대학이 월급·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취업률 부풀리기는 전국적인 현상이란 지적도 있다. 경기 부천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학 취업률이 높으면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동일화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러나 편법으로 취업률을 높이는 것은 국민과 수험생을 속이는 반칙”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현실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주장도 있다. 취업률이 낮으면 부실 대학으로 인식돼 예산을 지원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다. 실제로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기준항목 중 취업률이 중요한 잣대로 작용하며, 학교 자체적으로도 학과 구조조정 등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취업률이 51%에 미치지 못하면 부실 대학 선정 시 우선 검토 대상이 된다. 권경주 건양대 교수는 “대학이 취업률에 목맬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는 공정한 취업률 산정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근본적으로 정부가 인력충원 시스템을 개선하고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경제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