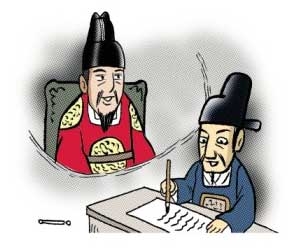мЭЄм°∞мЧР мє® мЮШл™ї лЖУмЭА мЭШкіА м≤Шл≤МлСРк≥† мВђнЧМлґАмЭШ мВђнШХ к±імЭШ мЭЉлґАлЯђ мґХмЖМ кµ≠мЩХмЭШ л™©кµђл©НмЬЉл°Ь лґИл†ЄлНШ мКєм†ХмЫР к≥µм†ХмД± мЮГмЬЉл©і кµ≠м†Х м†Дм≤імЧР нЖµм¶Э
мКєм†ХмЫРмЭА м°∞мД†мЛЬлМАмЧР мЩХл™Е мґЬлВ©мЭД кіАмЮ•нХШлНШ кіАм≤≠мЬЉл°Ь мШ§лКШлВ† лМАнЖµл†є лєДмДЬмЛ§мЧР нХілЛєнХЬлЛ§. м°∞мД†м°∞ лМАлґАлґДмЭШ кіАм≤≠мЭі мЩХ-мЭШм†ХлґА-мЬ°м°∞-мЭЉл∞Ш кіАм≤≠мЭілЭЉлКФ к≥ДнЖµ мЖНмЧР нПђнХ®лРЬ к≤Гк≥Љ лЛђл¶ђ мКєм†ХмЫРмЭА кµ≠мЩХ мІБмЖНмЭілЛ§. мШ§лКШлВ† м≤≠мЩАлМА лєДмДЬмЛ§мЭі лМАнЖµл†є мІБмЖНмЭЄ м†Рк≥Љ к∞ЩлЛ§. нХЬкµ≠мВђмЧРмДЬ кµ≠мЩХ лєДмДЬкЄ∞кµђмЭШ лУ±мЮ•мЭА л∞±м†Ь лХМ вАШлВімЛ†мҐМнПЙвАЩмЬЉл°Ь мЛЬмЮСлРШмІАлІМ мЭілКФ к∞Ьл≥Д кіАм≤≠мЭі мХДлЛИк≥† нКєм†Х кіАмІБмЭілЛ§. к≥†л†§мЛЬлМАмЧРлКФ м§СмґФмЫРк≥Љ мЭАлМА лУ±мЭі мД§мєШлПЉ кµ∞мВђ кЄ∞л∞Ак≥Љ мЩХл™Е мґЬлВ©мЭД кіАмЮ•нЦИлКФлН∞, нЫДкЄ∞мЧР мЭіл•ілЯђ м§СмґФмЫРмЭі мЭіл•Љ м†ДлЛінЦИлЛ§. кЈЄлЯђлВШ м§СмґФмЫРмЭА лєДмДЬ кЄ∞лК• лІРк≥†лПД кµ∞мВђ кЄ∞лК•мЭД нХ®кїШ кіАмЮ•нЦИлЛ§. м°∞мД† к±ікµ≠ мЭінЫДмЧР м§СмґФмЫРмЭі лЛілЛєнХШлНШ лєДмДЬ кЄ∞лК•лІМ лґДл¶ђнХі мКєм†ХмЫРмЭД лСРл©імДЬ кµ≠мЩХ лєДмДЬкЄ∞кµђл°ЬмДЬмЭШ лПЕл¶љмД±мЭі нЩХл≥ілРРлЛ§.
мКєм†ХмЫРмЭД мІАмє≠нХШлКФ л≥Дл™ЕмЭА мЧђлЯђ к∞АмІАк∞А мЮИлЛ§. мКєм†ХмЫРмЭД м§ДмЧђ м†ХмЫРмЭілЭЉк≥† нХШк±∞лВШ мЭАлМА лШРлКФ нЫДмЫР, нЫДмД§ лУ±мЭШ л≥Дмє≠мЬЉл°Ь лґИл†ЄлЛ§. мЧђкЄ∞мДЬ вАШнЫДвАЩ(еЦЙ)лКФ мЛ†м≤і мЭЉлґАлґДмЭЄ л™©кµђл©НмЭД лЬїнХЬлЛ§. нЭ•лѓЄл°≠к≤МлПД м°∞мД†мЛЬлМАмЧРлКФ м§СмЪФ кіАмІБмЭілВШ кіАм≤≠мЭД мВђлЮМмЭШ л™ЄмЧР лєДмЬ†нХі лІРнХШк≥§ нЦИлЛ§. кіАмЫРлУ§ к∞АмЪілН∞ мµЬк≥†мЬД кіАмЫРмЭЄ лМАмЛ†мЭА лЛ§л¶ђмЩА нМФмЭД мЭШлѓЄнХШлКФ вАШк≥†кµЙвАЩмЬЉл°Ь, нГДнХµк≥Љ к∞ДмЯБмЭД лЛілЛєнХШлНШ лМАк∞ДмЭА кЈАмЩА лИИмЭЄ вАШмЭіл™©вАЩмЬЉл°Ь, кЈЄл¶ђк≥† мКєм†ХмЫРмЭА л™©кµђл©НмЭД мЭШлѓЄнХШлКФ вАШнЫДмЫРвАЩмЬЉл°Ь лґИл†ЄлЛ§. мЛ†нХШлУ§мЭі кµ≠мЩХмЭШ лЛ§л¶ђмЩА нМФмЭімЮР, кЈАмЩА лИИмЭімЪФ, л™©кµђл©НмЭілЭЉлКФ к≤ГмЭілЛ§. нЫДмЫР м¶Й, л™©кµђл©НмЭА мКєм†ХмЫРмЭШ мД±к≤©мЭД к∞АмЮ• мЮШ нСЬнШДнХЬ лЛ®мЦік∞А мХДлЛРкєМ нХЬлЛ§. мКєм†ХмЫРмЭД л™©кµђл©НмЧР лєДмЬ†нХШлКФ лН∞лКФ мЧђлЯђ к∞АмІА мЭімЬ†к∞А мЮИк≤†мЬЉлВШ к∞АмЮ• м§СмЪФнХЬ к≤ГмЭА мКєм†ХмЫРмЭШ м£ЉмЪФ кЄ∞лК•мЭЄ мЩХл™Е мґЬлВ©к≥Љ кіАк≥ДлРЬлЛ§. мЮЕмЭД нЖµнХі лУ§мЦімШ® л™®лУ† мЭМмЛЭлђЉмЭі л™©кµђл©НмЭД нЖµнХі лДШмЦік∞АлѓАл°Ь, лІМмХљ л™©кµђл©НмЧР мІИнЩШмЭі мЮИлЛ§л©і мГБлЛєнЮИ к≥†нЖµмК§лЯђмЪЄ к≤ГмЭілЛ§. лІИм∞ђк∞АмІАл°Ь л™©кµђл©НмЧР нХілЛєлРШлКФ мКєм†ХмЫРмЧР лђЄм†Ьк∞А мЮИлЛ§л©і мЭілКФ мЛђк∞БнХЬ кµ≠м†Х нШЉлЮАмЭД к∞Ам†ЄмШђ к≤ГмЭі мЮРл™ЕнХШлЛ§.
мКєм†ХмЫРмЭШ мЩХл™Е мґЬлВ©мЭД лЛ®мИЬнЮИ кЄ∞лК•м†БмЭЄ к≤ГмЬЉл°ЬлІМ мЭінХінХШл©і мШ§мВ∞мЭілЛ§. мШ§лКШлВ†к≥Љ к∞ЩмЭі мВЉкґМлґДл¶љмЭі мЭіл§ДмІАмІА мХКмХШлНШ м°∞мД† мВђнЪМмЧР кµ≠мЩХмЭШ л™Ел†ємЭА л∞Фл°Ь л≤ХмЭі лРШлѓАл°Ь мЩХл™Е мґЬлВ©мЭА лНФмЧЖмЭі м§СмЪФнХЬ мЭЉмЭімЧИлЛ§. мЩХл™Е мґЬлВ©мЧР мШ§л•Шк∞А мЮИмЭД к≤љмЪ∞мЧРлКФ мВђлЮМмЭД мВіл¶ђкЄ∞лПД нШємЭА м£љмЭікЄ∞лПД нХ† мИШ мЮИмЧИлЛ§. 1649лЕД(нЪ®мҐЕ м¶ЙмЬДлЕД) 6мЫФ мВђнЧМлґАмЩА мКєм†ХмЫР мВђмЭімЧР лЕЉлЮАмЭі мЮИмЧИлКФлН∞, мЭЄм°∞к∞А мКєнХШнХШкЄ∞ мІБм†ДмЧР мєШл£Мл•Љ лЛілЛєнЦИлНШ мЭШкіА мЭінШХмЭµмЭШ м≤Шл≤МмЧР лМАнХЬ к≤ГмЭімЧИлЛ§. мВђлІЭ мІБм†ДмЧР мЭінШХмЭµмЭі мЭЄм°∞мЧРк≤М мє®мЭД лЖУмХШлКФлН∞ нШИмЭД мЮШл™ї мІЪмЦі лђЄм†Ьк∞А лРШмЮР мВђнЧМлґАмЧРмДЬлКФ мЭінШХмЭµмЭД вАШмХИмЬ®м†Хм£ДвАЩ(жМЙеЊЛеЃЪзљ™)нХШмЮРк≥† м£ЉмЮ•нЦИлКФлН∞, лЛ§л¶Д мХДлЛМ мВђнШХмЧР м≤ШнХШмЮРлКФ к≤ГмЭімЧИлЛ§. нХШмІАлІМ мКєм†ХмЫРмЭА мВђнЧМлґАмЭШ к±імЭШмЩА кµ≠мЩХ л™Ел†ємЭД м†ДлЛђнХШлКФ к≥Љм†ХмЧРмДЬ вАШмХИмЬ®вАЩмЭілЭЉлКФ лСР кЄАмЮРл•Љ мЮДмЭШл°Ь лєЉ вАШм†Хм£ДвАЩлЭЉлКФ нСЬнШДлІМ м†ДлЛђнЦИлЛ§. м†Хм£ДлЮА кЉ≠ мВђнШХмЭД лЬїнХШлКФ к≤ГмЭА мХДлЛИлЛ§. к≤∞к≥Љм†БмЬЉл°Ь нЪ®мҐЕмЧР мЭШнХі мХИмЬ®м†Хм£Дл°Ь лЛ§мЛЬ к≤∞м†ХлРШкЄ∞лКФ нЦИмІАлІМ мЭі к≥Љм†ХмЧРмДЬ нСЬнШДмЭі л∞ФлАМк≤М лРЬ м±ЕмЮДмЭД мІАк≥† нХілЛє мКємІА м†ХмЬ†мД±мЭі нММмІБлРРлЛ§.
|
|
| мЭікЈЉнШЄ л™ЕмІАлМА мЧ∞кµђкµРмИШ
|
лЛємЛЬ мВђнЧМлґАмЧРмДЬлКФ вАЬмКєм†ХмЫРмЭШ м≤ШмВђл°Ь л≤ХмЭД мІСнЦЙнХШлКФ мЭШл¶ђк∞А мґФлЭљнЦИлЛ§вАЭл©∞ мЛ†лЮДнХШк≤М к≥µк≤©нЦИлЛ§. кµ≠мЩХмЭШ л™©кµђл©НмЭЄ мКєм†ХмЫРмЭі к≥µм†ХмД±мЭД мЮГк≤М лРШл©і мЭінШХмЭµмЭШ мВђл°АмЧРмДЬм≤ШлЯЉ м°∞м†Х м†Дм≤імЧР мШБнЦ•мЭД м£ЉлКФ мЛђк∞БнХЬ лђЄм†Ьк∞А мГЭкЄЄ мИШ мЮИмЧИлЛ§.
мКєм†ХмЫРмЭА лШР к∞Б кіАм≤≠мЧРмДЬ мШђлЭЉмШ§лКФ л≥ік≥†мЩА мЭімЧР лМАнХЬ мЩХмЭШ к≤∞мЮђ мВђнХ≠мЭД к∞Б кіАм≤≠мЧР нХШлЛђнХШлКФ мЧ≠нХ†мЭД нЦИлЛ§. мШ§лКШлВ† кіАл≥імЩА мЬ†мВђнХЬ м°∞л≥іл•Љ л∞ЬнЦЙнЦИлЛ§. лШР кґБкґРлђЄмЭШ мЧімЗ† кіАл¶ђлПД кіАмЮ•нЦИлЛ§. м°∞мД†мЭШ мХДмє®мЭА лМАкґРлђЄмЭі мЧіл¶ђл©імДЬ мЛЬмЮСлРЬлЛ§к≥† нХілПД к≥ЉмЦЄмЭі мХДлЛИлЛ§. лМАкґРлђЄмЭА лЛ®мИЬнХЬ мґЬмЮЕлђЄ мЭімГБмЭШ нБ∞ мЭШлѓЄл•Љ к∞ЦлКФлН∞, кЈЄ мµЬмҐЕ м±ЕмЮДмЭі мКєм†ХмЫРмЧР мЮИмЧИлЛ§.
вЦ†нХЬкµ≠нЦЙм†ХмЧ∞кµђмЫР вАШмЧ≠мВђ мЖН нЦЙм†ХмЭімХЉкЄ∞вАЩ мЪФмХљ
мЭікЈЉнШЄ мЧ∞кµђкµРмИШ (л™ЕмІАлМА)
2018-03-26 35л©і
Copyright вУТ мДЬмЪЄмЛ†лђЄ All rights reserved. лђілЛ® м†ДмЮђ-мЮђл∞∞нПђ, AI нХЩмКµ л∞П нЩЬмЪ© кЄИмІ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