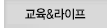ВДђвѓюьЋ┤ ВХЕвѓевЈёВИА вДцВъЁ ВџћВ▓Г Ж▒░вХђ
вїђВаёВІюЖ░ђ ВўЏ ВХЕвѓевЈё Ж┤ђВѓгВ┤ї вДцВъЁ вгИВаювЦ╝ вєЊЖ│а РђўВцЈвїђ ВЌєвіћРђЎ ьќЅВаЋВЮё ьЋўЖ│а ВъѕвІц. вІ╣В┤ѕ вДцВъЁВЮё Ж▒░вХђьќѕвІцЖ░ђ ВІюв»╝вІеВ▓┤ вЊ▒ВЮ┤ ВЋЋв░ЋьЋўВъљ ВъЁВъЦВЮё в▓ѕв│х, вѓ┤вЁё ВІюВъЦ ВёаЖ▒░вЦ╝ ВЮўВІЮьЋю ВЌгвАа ьќЅВаЋВЮё ВЮ╝Вѓ╝Ж│а ВъѕвІцвіћ ВДђВаЂЖ╣їВДђ вѓўВўцЖ│а ВъѕвІц.| вїђВаёВІю ВцЉЖхг вїђьЮЦвЈЎВЌљ Въѕвіћ ВўЏ ВХЕвѓевЈёВДђВѓг Ж┤ђВѓг. вЈё Ж┤ђВѓгВ┤ї ВцЉВЌљВёю Ж░ђВъЦ ьЂ░ Ж┤ђВѓгвАю ВЮ┤Ві╣вДї Ваё вїђьєхва╣ВЮ┤ 6┬и25 ВаёВЪЂ вЋї ьЋю вІг Ж░ё веИвг╝вЕ┤Вёю ВДЉвг┤вЦ╝ в│И ВаЂВЮ┤ Въѕвіћ вЊ▒ Ж░ђВ╣ўЖ░ђ вєњВЋё вїђВаёВІю вгИьЎћВъгВъљвБї 49ьўИвАю ВДђВаЋвЈ╝ ВъѕвІц. ВХЕвѓевЈё ВаюЖ│х |
31ВЮ╝ вїђВаёВІюВЌљ вћ░вЦ┤вЕ┤ ВІювіћ ВДђвѓю 30ВЮ╝ ВўЏ вЈё Ж┤ђВѓгВ┤їВЮё вДцВъЁьЋ┤ ВўѕВѕаВъЉьњѕ ВЃЮВѓ░┬иВаёВІю┬иьїљвДц Ж│хЖ░ёВю╝вАю вДївЊцЖ▓авІцЖ│а ВаёЖ▓Е в░юьЉюьќѕвІц. ВЮ┤ Ж┤ђВѓгВ┤їВЮђ ВЮ╝ВаюЖ░ЋВаљЖИ░ВЮИ 1932вЁё ВХЕвѓевЈёВ▓ГВЮ┤ Ж│хВБ╝ВЌљВёю вїђВаёВю╝вАю Вў«Ж▓еВўцвЕ┤Вёю вЈёВДђВѓгВЎђ вЈё Ж░ёвХђВЮў ВБ╝Ж▒░вЦ╝ ВюёьЋ┤ ВДђВЮђ Ж▓ЃВю╝вАю 9ьЋёВДђ(1вДї 345сјА)ВЌљ ВБ╝ьЃЮ 10В▒ёЖ░ђ ьЋюЖ││ВЌљ вфеВЌг Въѕвіћ ЖхГвѓ┤ ВюаВЮ╝ВЮў Вхювїђ Ж┤ђвБї Ж▒░ВБ╝ВДђвІц.
ВХЕвѓевЈёвіћ ВДђвѓюьЋ┤ вДљ ьЎЇВё▒┬иВўѕВѓ░ВЌљ ВА░Вё▒ьЋю вѓ┤ьЈгВІавЈёВІювАю вЈёВ▓ГВЮё ВЮ┤ВаёьЋўЖИ░ВЌљ ВЋъВёю вЈёВДђВѓг Ж┤ђВѓг вЊ▒ВЮ┤ вїђВаёВІю вгИьЎћВъгВъљвБї 49ьўИВЮИ ВаљВЮё вЊцВќ┤ ВІюЖ░ђ вДцВъЁьЋ┤ ьЎюВџЕьЋа Ж▓ЃВЮё ВџћВ▓ГьќѕвІц. ьЋўВДђвДї ВІювіћ ВДђвѓюьЋ┤ 12ВЏћ РђюьЎюВџЕ Ж│ёьџЇВЮ┤ ВЌєвІцРђЮвЕ░ вДцВъЁВЮё Ж▒░вХђьќѕвІц. ВІювіћ вїђВаёв░юВаёВЌ░ЖхгВЏљВЌљ Ж┤ђВѓгВ┤ї ьЎюВџЕв░ЕВЋѕ ВЌ░ЖхгВџЕВЌГВЮё ВЮўвб░ьЋ┤ ьЋю вІг ВаёВЌљ ВџЕВЌГЖ▓░Ж│╝вЦ╝ в░ЏВЋёвєЊЖ│авЈё ВЮ┤ Ж░ЎВЮђ ВъЁВъЦВЮё вЈёВЌљ ВаёвІгьќѕвІц. ВЌ░ЖхгВЏљВЮђ вІ╣ВІю ВџЕВЌГЖ▓░Ж│╝ВЌљВёю вгИьЎћВўѕВѕаВ┤ї, вгИьЎћьЁївДѕв╣ївдгВДђ, Жи╝вїђвгИьЎћВ▓┤ьЌўвДѕВЮё вЊ▒ 3Ж░ђВДђ Ж┤ђВѓгВ┤ї ьЎюВџЕв░ЕВЋѕВЮё ВІюВЌљ ВаюВІюьќѕВЌѕвІц.
ВЮ┤ВЌљ вћ░вЮ╝ вЈёвіћ в╣ѕ Ж┤ђВѓгВ┤їВЮў Ж▓йв╣ёвЦ╝ ВаёвгИВЌЁВ▓┤ВЌљ вДАЖИ░Ж│а Ж│хЖ░ювДцЖ░ЂВЌљ вѓўВё░вІц. Ж░љВаЋЖ░ђвіћ 76ВќхВЏљВю╝вАю вѓўВЎћвІц. ЖиИвдгЖ│а ВЮ┤в▓ѕ ВБ╝ ВъЁВ░░ Ж│хЖ│авЦ╝ вѓИ вњц вДцЖ░ЂВЌљ вѓўВёц В░ИВЌљ в░ўвЁёЖ░ё ьЃювЈёв│ђьЎћЖ░ђ ВЌєвЇў ВІюЖ░ђ вЈїВЌ░ вДцВъЁ ВЮўВѓгвЦ╝ в░Юьъї Ж▓ЃВЮ┤вІц. ВІюв»╝вІеВ▓┤ВЌљВёю вДцВъЁВЮё Ж░ЋваЦ В┤ЅЖхгьЋю вњцвІц.
вїђВаёвгИьЎћВЌ░вїђвіћ ВхюЖи╝ Вё▒вфЁВЮё вѓ┤Ж│а РђювгИьЎћВъг Ж░ђВ╣ўЖ░ђ вєњВЮђ Ж┤ђВѓгВ┤їВЮ┤ в»╝Ж░ёВЌљ ьїћвдгвЕ┤ ьЏ╝ВєљвљювІц. вїђВаёВІювіћ ВА░ВєЇьъѕ ВъЁВъЦВЮё в░ЮьъѕЖ│а ьЎюВџЕв░ЕВЋѕВЮё вѓ┤вєЊВю╝вЮ╝РђЮЖ│а ВЋЋв░ЋьќѕвІц.
ьЎюВџЕв░ЕВЋѕвЈё Ж░ЉВъљЖИ░ вѓўВЎђВёюВЮИВДђ ВАИВєЇВЮ┤вІц. ЖхгВЃЂвДї ВаЋьЋ┤ВАїВЮё в┐љ ЖхгВ▓┤ВаЂВЮИ Ж│ёьџЇВЮ┤ ВЌєвІц. вїђВаёв░юВаёВЌ░ЖхгВЏљВЌљВёю вѓ┤вєЊВЮђ 3Ж░ђВДђ ьЎюВџЕв░ЕВЋѕЖ│╝вЈё вІгвЮ╝ ьЌЏВџЕВЌГВЮё ьќѕвІцвіћ в╣ёвѓюВЮё ьћ╝ьЋа Вѕў ВЌєЖ▓ї вљљвІц. ВЮ┤ьўёв»И ВўѕВѕаВДёьЮЦЖ│ёВъЦВЮђ РђюьЎюВџЕЖ│ёьџЇВЮ┤ ВЋёВДЂ ЖхгВ▓┤ьЎћвљўВДђ ВЋіВЋўЖ│а, ВџЕВЌГВЌљВёю вѓ┤вєЊВЮђ ВёИ Ж░ђВДђ в░ЕВЋѕ ВцЉ вћ▒ вЊцВќ┤вДъвіћ Ж▓ЃВЮђ ВЌєвІцРђЮЖ│а ьёИВќ┤вєевІц.
Ж░ЋВ▓аВІЮ ВІю вгИьЎћВ▓┤ВюАЖхГВъЦВЮђ РђюьўёВъг ЖхГьџїВЌљ Ж│ёвЦў ВцЉВЮИ вЈёВ▓ГВЮ┤Ваёьі╣в│ёв▓ЋВЮ┤ ьєхЖ│╝вљўвЕ┤ Ж┤ђВѓгВ┤їВЮё ВаЋвХђвАювХђьё░ вг┤ВЃЂ ВќЉВЌгв░ЏВЮё Вѕў ВъѕЖ│а, Ж▓ђьєаЖ│╝ВаЋВЮ┤ ЖИИВќ┤ВаИ Вѓ░вІц ВЋѕ Вѓ░вІц вфЁьЎЋьЋўЖ▓ї вІхв│ђьЋа Вѕў Въѕвіћ ВъЁВъЦВЮ┤ ВЋёвІѕВЌѕвІцРђЮЖ│а ьЋ┤вфЁьќѕвІц.
вїђВаё ВЮ┤В▓юВЌ┤ ЖИ░Въљ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