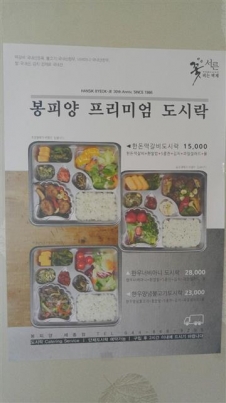이를테면 “서울행이 줄어들 것이다”, “회식을 덜 할 것이다”와 같은 기대감 때문입니다. 한 세종시 공무원은 “그동안은 서울에서 민간기업 사람들을 만나 그들이 제공하는 저녁식사 등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으니 외려 몸은 편해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세종시 공무원도 “김영란법의 요체는 밥값이 3만원을 넘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만남 자체를 갖지 말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어서 일부러 사람들을 만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근무 여건이 한결 나아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 20대 공무원들은 “회식 자리가 줄어들 것 같다”고 기대했습니다.
청렴하고 갑질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김영란법의 취지에서 봤을 때 아예 화근이 될 만한 모임장소로 이동하지 않겠다는 공무원들의 생각도 일부 이해됩니다. 다만 지금도 세종시에 근무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과천에 있을 때보다 현장에 잘 나가지 않고 ‘책상머리형 정책’을 구상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것이 더 심해질까 우려됩니다. 세종시에 갇혀 현실과 괴리감 있는 정책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정부와 기업을 두루 경험한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경제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한 이후 공무원들이 현장에 잘 가지 않는다”며 “현장을 찾아 얘기를 많이 들어야 좋은 정책이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식사비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로만 규제 완화, 기업 지원을 외치지 말고 직접 민원서류 들고 해당 관청을 뛰어 체감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김영란법이 엉뚱한 방향으로 부작용을 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8-0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