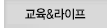көӯнҶ мөңлӮЁлӢЁ л§ҲлқјлҸ„к°Җ лҠҗлӢ·м—ҶлҠ” кіЁн”„м№ҙнҠё көҗнҶөмӮ¬кі лЎң лӘёмӮҙмқ„ м•“кі мһҲлӢӨ. кіЁн”„м№ҙнҠёлҠ” 섬м—җ лӮҙлҰ° л’Ө л°° м¶ңл°ң мӢңк°„м—җ л§һ추лҠҗлқј мқјм •мқҙ л№ л“Ҝн•ң кҙҖкҙ‘к°қл“Өмқ„ кІЁлғҘн•ҙ л“Өм—¬мҳЁ кІғмңјлЎң л§ҲлқјлҸ„мқҳ көҗнҶөмҲҳлӢЁмқҙ лҗң м§Җ мқҙм ң м ңлІ• мҳӨлһҳлҗҗлӢӨ.
к·ёлҹ¬лӮҳ мөңк·јм—җлҠ” мӮ¬кі к°Җ л№Ҳл°ңн•ң лҚ°лӢӨ 섬 кө¬м„қкө¬м„қмқ„ л§Ҳкө¬ н—Өм§‘кі лӢӨлӢҲлҠ” кұҙ л¬јлЎ , лҸ„к°Җ л„ҳмқҖ нҳёк°қн–үмң„к№Ңм§Җ м„ңмҠҙм§Җ м•ҠлҠ” нҶөм—җ лҸ„ліҙ кҙҖкҙ‘к°қл“Өмқҳ лҲҲмӮҙмқ„ м°Ңн‘ёлҰ¬кІҢ н•ҳкі мһҲлӢӨ.
кіЁн”„м№ҙнҠёк°Җ кіЁн”„мһҘмқҙ м•„лӢҢ л§ҲлқјлҸ„м—җ л“ұмһҘн•ң кұҙ 2005л…„ 12мӣ”. к·ён•ҙ 1мӣ” мЈјлҜјл“ӨмқҖ вҖңмІңм—°кё°л…җл¬ј(423нҳё) л§ҲлқјлҸ„лҠ” мһҗлҸҷм°Ёк°Җ м—ҶлҠ” кіімңјлЎң ліҙмЎҙн•ҙм•ј н•ңлӢӨ.вҖқл©° 20м—¬лҢҖмқҳ мһҗлҸҷм°ЁлҘј лӘЁл‘җ 섬 л°–мңјлЎң лӮҙліҙлғҲлӢӨ.
мқҙнӣ„ л§ҲлқјлҸ„лҠ” мһҗлҸҷм°Ёк°Җ м—ҶлҠ” мІӯм •нҷҳкІҪнҠ№кө¬лЎң м§Җм •лҗҗлӢӨ. к·ёлҹ°лҚ° 11к°ңмӣ” л’Өмқё 12мӣ” н•ң мЈјлҜјмқҙ м „лҸҷ кіЁн”„м№ҙнҠёлҘј л“Өм—¬мҷҖ кҙҖкҙ‘к°қмқ„ мғҒлҢҖлЎң мҳҒм—…мқ„ мӢңмһ‘н–ҲлӢӨ. к·ёлҹ¬мһҗ лӢӨлҘё мЈјлҜјл“ӨлҸ„ л„ҲлҸ„лӮҳлҸ„ кіЁн”„м№ҙнҠёлҘј л“Өм—¬мҷ”кі , нҳ„мһ¬ л§ҲлқјлҸ„м—җлҠ” 80м—¬лҢҖмқҳ кіЁн”„м№ҙнҠёк°Җ м„ұм—… мӨ‘мқҙлӢӨ. к°ҖмһҘ нҒ° л¬ём ңлҠ” н•ҙл§ҲлӢӨ кіЁн”„м№ҙнҠё көҗнҶөмӮ¬кі к°Җ мһҮл”°лҘҙкі мһҲлӢӨлҠ” кІғ. м§ҖлӮң 15мқјм—җлҠ” м •мӣҗмқ„ мҙҲкіјн•ҙ 20м—¬лӘ…мқ„ нғңмҡҙ 14мқёмҠ№ кіЁн”„м№ҙнҠёк°Җ лӮҙлҰ¬л§үкёёмқ„ 30вҲј40пҪҚ лӮҙлӢ¬лҰ¬лӢӨ мһҘкө°л°”мң„ н‘ңм§ҖнҢҗмқ„ л“Өмқҙл°ӣм•„ мқјк°ҖмЎұ 5лӘ…мқҙ л¶ҖмғҒмқ„ мһ…м—ҲлӢӨ. к·ёлҹ¬лӮҳ м ңмЈјлҸ„мҷҖ кІҪм°°мқҖ лҫ°мЎұн•ң к·ңм ңл°©м•Ҳмқҙ м—Ҷм–ҙ мҶҚл§Ң нғңмҡ°кі мһҲлӢӨ.
м ңмЈј нҷ©кІҪк·јкё°мһҗ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