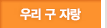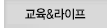лҢҖнҷ”к°Җ мӢңмһ‘лҗҳкё° м „ н•ңл°”нғ• мҶҢлҸҷл¶Җн„° л№ҡм–ҙмЎҢлӢӨ. лҢҖнҷ” мһҘмҶҢлҘј нҡҢмқҳмӢӨлЎң м •н•ң мӮ¬мӢӨмқ„ нғҗнғҒмһ–кІҢ м—¬кёҙ м„ұ кө¬мІӯмһҘмқҙ кө¬мІӯмһҘмӢӨлЎң л°”кҫј лҚ° мқҙм–ҙ лҢҖнҷ”м—җ лҒјкё° мң„н•ҙ кө¬мІӯмһҘмӢӨ м•һм—җ мӨ„мӨ„мқҙ лҢҖкё° мӨ‘мқё кіөл¬ҙмӣҗл“Өм—җкІҢ мӮ¬л¬ҙмӢӨлЎң лҗҳлҸҢм•„к°Ҳ кІғмқ„ м§ҖмӢңн–Ҳкё° л•Ңл¬ёмқҙлӢӨ.
| м„ұмһҘнҳ„ мҡ©мӮ°кө¬мІӯмһҘмқҙ 5мқј вҖҳлҢҖнҷ”мқҳ лӮ вҖҷмқ„ л§һм•„ кө¬мІӯмһҘмӢӨмқ„ м°ҫмқҖ мЈјлҜјл“Өкіј м–ҳкё°лҘј лӮҳлҲ„кі мһҲлӢӨ. мҡ©мӮ°кө¬ м ңкіө |
мҳӨм „ 10мӢң мІ« мЈјлҜјмқҙ кө¬мІӯмһҘмӢӨлЎң л“Өм–ҙмҷ”лӢӨ. к№ҖлӘЁ(42В·мқҙнғңмӣҗ1лҸҷ)м”ЁлҠ” вҖңлҸҷл„Ө м–ҙлҘҙмӢ мқ„ лҢҖн•ҳлҠ” л§ҲмқҢмңјлЎң мҷ”лӢӨ.вҖқкі мҡҙмқ„ л—Җ л’Ө лҸҷл„Өм—җ лҢҖн•ң л¶ҲнҺёкіј л¶Ҳл§Ң л“ұмқ„ мҸҹм•„лғҲлӢӨ. м„ұ кө¬мІӯмһҘмқҖ вҖңмІ«мҲ м—җ л°°к°Җ л¶ҖлҘҙм§Җ м•ҠмңјлӢҲ, м„ңм„ңнһҲ л°”кҝ”лӮҳк°ҖкІ лӢӨ. м§Җмјңлҙҗ лӢ¬лқј.вҖқкі лӢ№л¶Җн–ҲлӢӨ.
л‘җлІҲм§ё мЈјлҜјл“Өмқҙ л“Өм–ҙмҳӨмһҗ м„ұ кө¬мІӯмһҘмқҖ мһҗлҰ¬м—җм„ң лІҢл–Ў мқјм–ҙлӮ¬лӢӨ. мқҙлӘЁ(87В·лӮЁмҳҒлҸҷ)м”ЁлҠ” 비лЎҜн•ҙ 70~80лҢҖ л…ёмқё 3лӘ…мқҙ м°ҫм•ҳкё° л•Ңл¬ёмқҙлӢӨ. лӘ©мҡ”мқјмқ„ лҢҖнҷ”мқҳ лӮ лЎң м§Җм •н•ң мқҙмң к°Җ м—¬кё°м„ң лӮҳмҷ”лӢӨ.
вҖңл…ёмқёл§Ң мӮ¬лҠ” к°ҖлӮңн•ң лҸҷл„ӨвҖқлқјлҠ” н•ҳмҶҢм—° л°ҳ, н‘ёл…җ л°ҳмңјлЎң мӢңмһ‘лҗң л…ёмқёл“Өмқҳ мқҙм•јкё°лҠ” 30분к°Җлҹү мқҙм–ҙмЎҢлӢӨ. мқҙм—җ м„ұ кө¬мІӯмһҘмқҖ мӮ¬м•Ҳлі„лЎң м—…л¬ҙ мІҳлҰ¬ м Ҳм°Ё л“ұмқ„ кјјкјјнһҲ м„ӨлӘ…н•ң л’Ө вҖңлӢӨмқҢм—җлҠ” м°ҫм•„лөҗ н…ҢлӢҲ м»Өн”ј н•ңмһ” мЈјм„ёмҡ”.вҖқлқјкі л§җмқ„ л§әм—ҲлӢӨ.
мқҙм–ҙ л…ёмҲҷмқё мүјн„°лҘј м§Җмӣҗн•ҙ лӢ¬лқјлҠ” мЈјлҜј, мһ¬к°ңл°ң мЎ°н•©мқҳ л¶Җм Ғм Ҳн•ң н–үмң„лҘј м§Җм Ғн•ҳлҠ” мЎ°н•©мӣҗ л“ұмқ„ мһҮл”°лқј л§ҢлӮҳмһҗ мҳӨм „мқҙ нӣҢм©Қ м§ҖлӮ¬лӢӨ. мқҙм–ҙ кө¬лӮҙмӢқлӢ№м—җм„ң лҳҗ лӢӨлҘё мЈјлҜјл“Өкіј м җмӢ¬мқ„ н•Ёк»ҳ н•ҳл©° м–ҳкё°лҘј лӮҳлҲ„кі , лӢӨмӢң кө¬мІӯмһҘмӢӨлЎң лҸҢм•„мҷҖ 6нҢҖмқҳ мЈјлҜјмқ„ 추к°ҖлЎң л§ҢлӮ¬лӢӨ. мқҙлӮ лҢҖнҷ”лҠ” мҳӨнӣ„ 5мӢңлҘј л„ҳкІЁ л§Ҳл¬ҙлҰ¬лҗҗлӢӨ.
лӢӨмҶҢ м–ҙкұ°м§ҖлЎң лҠҗк»ҙм§ҖлҠ” мЈјлҜј мҡ”кө¬м—җлҠ” вҖңк¶Ңн•ң л°–мқҳ мқјмқ„, мұ…мһ„м§Җм§Җ лӘ»н• мқјмқ„ н•ҳкІ лӢӨкі м•ҪмҶҚл“ңлҰ¬кё°м—җлҠ” мЎ°мӢ¬мҠӨлҹҪлӢӨ.вҖқл©° мҷ„кіЎн•ң н‘ңнҳ„м—җ к°•н•ң м–ҙмЎ°лҘј лӢҙм•„ м„ мқ„ к·ём—ҲлӢӨ.
м„ұ кө¬мІӯмһҘмқҖ вҖңкіөл¬ҙмӣҗл“Өмқҙ мһҗмЈј л§җн•ҳлҠ” вҖҳкІҖнҶ н•ҳкІ мҠөлӢҲлӢӨ.вҖҷлҠ” мЈјлҜјл“Өмқҙ мӣҗн•ҳлҠ” лӢөмқҙ м•„лӢҲлӢӨ.вҖқл©ҙм„ң вҖңлҢҖнҷ”лҘј нҶөн•ҙ м ңлҢҖлЎң лҗң лӢөмқ„ м°ҫм•„лӮј кІғмқҙл©°, мһ„кё°к°Җ лҒқлӮ л•Ңк№Ңм§Җ ліҖн•Ём—Ҷмқҙ м§ҖмҶҚн• мғқк°ҒвҖқмқҙлқјкі лҚ§л¶ҷмҳҖлӢӨ.
мҡ©мӮ°кө¬ мЈјлҜјмқҙ м„ұ кө¬мІӯмһҘмқ„ л§ҢлӮҳлҠ” л°©лІ•мқҖ к°„лӢЁн•ҳлӢӨ. мҳҲм•ҪмқҖ н•„мҡ”м—Ҷкі , л§ӨмЈј лӘ©мҡ”мқј 9мёө кө¬мІӯмһҘмӢӨмқ„ м°ҫмңјл©ҙ л°©л¬ё мҲңм„ңлҢҖлЎң л§ҢлӮ мҲҳ мһҲлӢӨ. л¬ҙмҠЁ м–ҳкё°лҘј кәјлӮјм§Җ мӮ¬м „м—җ м•ҢлҰ¬м§Җ м•Ҡм•„лҸ„ лҗңлӢӨ. лҢҖнҷ”лҠ” лҢҖкё°мһҗк°Җ м—Ҷмқ„ л•Ңк№Ңм§Җ 진н–үлҗңлӢӨ.
мһҘм„ёнӣҲкё°мһҗ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