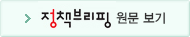산불이 많이 나는 7개 유형은 인공림이면서 침엽수가 주를 이루고 하층식생이 풍부한 경우, 인공림이면서 소나무숲인데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목을 쌓아둔 경우, 천연림이면서 침엽수인데 하층식생이 풍부한 경우, 천연림이면서 활엽수인데 하층식생이 풍부한 경우 등이었다. 상대적으로 침엽수인 경우 산불이 잘 나고, 봄철에 바짝 말라있는 하층식생(낙엽, 풀, 덩굴 등)이 풍부할 경우 산불이 지표면에서 나무 위로 번지고 불도 하층부에서 오래 타기에 산불에 취약하다는 것이었다. 이런 사정상 인공림은 물론 천연림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숲가꾸기가 필요하다는 해법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천연림이나 활엽수림에서는 산불이 안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올해 3월 일본 이와테현 오후나토시에서 발생한 산불은 최근 최대규모로 피해면적 역시 3,400ha에 달했는데, 천연림이 44%, 활엽수림이 38%여서, 이러한 산림 유형도 결코 산불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입증하였다. 실제로도 대부분의 산림이 천연림이자 활엽수림인 남미의 아마존이나 아프리카의 콩고 분지 지역, 동남아시아의 열대림에서도 최근 기후위기 때문에 날로 길어지고 극심해지는 건기에는 무수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올 봄 산불 피해 이후의 종합적인 혁신방안을 담은 '산불종합대책'을 지난 10월에 발표하였다. 이 대책에서는 '산림구조 대전환'을 비중있게 강조하고 있다. 과밀한 숲은 솎아베기를 집중하고, 나무의 간격 확보, 밀도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침엽수, 활엽수를 섞어서 심고, 산불발생 위험지역에는 폭 50m의 내화수림대도 조성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정책 프로그램은 일본 소방청과 임야청의 합동 조사연구결과와 일치하는 정책방향이기도 하다.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숲은 가만히 놔두면 다 해결된다'라는 감정적 맹신에 기초한 주장을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숲의 1/4이 빽빽한 소나무림인데, 산불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나무숲을 '가만히 놔둘 수'는 없지 않은가? 이번 '산불종합대책'은 '적극적인 산림관리가 선도적인 산불예방'임을 강조하고 있다. UN 등 국제기구의 글로벌 전문가들의 의견도 마찬가지이다. 산불대응에서도 중요한 것은, 엄정한 '과학'과 단호한 '실천력'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