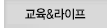시민단체 “중앙당 권력 변질” 지적
1995년 기초단체장 선거 때부터 도입된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책임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비례대표를 통해 전문가들의 참여를 이끈다는 대명제에도 불구하고 각종 폐해와 부작용이 6·2 지방선거에서 속출하면서 ‘정당공천제 폐지론’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공천심사 역시 인물검증보다는 차기 총선이나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인 공천이 많았다.
한마디로 무늬만 정당공천제이지 실제로는 국회의원의 사유화된 공천이라는 지적이다.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의 수준을 높이고 책임정치를 구현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정당공천제는 ‘후보검증’과 ‘전문가 영입’이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당의 입맛에 맞는 후보 공천과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공식을 만들어냈다.
후보자들은 공천권자인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잘 보이려고 중앙당 행사부터 집안 대소사에까지 시시콜콜 참여하며 눈도장을 찍는 데 열을 올릴 수밖에 없다.
또 소선거구제 하의 기초의회는 1지역 2인이 의회에 진출하기 때문에 지역의 대표성이 떨어지고, 정책협의도 중앙당의 지령을 받고 당 대 당 대결구도를 취함에 따라 흡사 여의도정치의 축소판이 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기초의원만큼은 반드시 정당공천을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윤성이 경희대 교수는 “지역 의원들이 유권자를 위해 일하기보다 자신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중앙정치인의 수족 노릇에 더욱 열심이다.”면서 “지역의원을 주민을 위해 일하는 대표로 되돌려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초의원만이라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 공천제의 대표적 병폐인 ‘밀실공천’ ‘공천헌금’ 역시 여전히 논란거리다.
지난 4월 이기수 전 여주군수가 지역 국회의원에게 2억원을 건네려다 체포됐고 인천 지역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기초의회 예비후보에게서 돈을 받아 물의를 빚었다.
‘특정 지역, 특정 정당 공천’만 받으면 사실상 당선이나 다름없어 ‘공천장사’라는 뒷거래가 생겼다. ‘공정가격’이 나돌 정도다. 한나라당의 경우 이번 지방선거 공천심사 과정 내내 ‘밀실공천’ 의혹에 시달렸고 ‘공천심사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다.’며 탈락자들이 반발했다. 적지 않은 탈락자들이 당의 밀실공천을 비판하며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진풍경을 빚기도 했다.
이로 인한 보수층 표 분산이 서울에서 한나라당 구청장 후보들의 패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민주당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 일부 자치구에선 경선이 끝났음에도 ‘정략공천’을 명분으로 후보자를 중앙당에서 선정, 잡음이 일기도 했다.
정당공천제가 ‘묻지마 투표’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권자들이 별도의 후보 검증 없이 지지 정당 간판만 보고 투표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 텃밭으로 불렸던 경상도와 강원도, 민주당 텃밭인 전라도의 경우는 ‘당 간판만 달면 당선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묻지마 투표가 성행하고 있다.
김영래 아주대 교수는 “공천제가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공식을 만들어 선거제도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 뿐 아니라 공천헌금 등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하루 빨리 정당공천제를 폐지, 올바른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