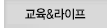ÍĻÄžėĀŪėł ŚČć ž≤≠ž£ľžĚėŽ£Ćžõźžě•žĚė Í≤©ž†ē Ū܆Ž°ú‚Ķ žßÄžěźž≤ī žāįŪēėÍłįÍīÄžě•žĚė ŪėĄžč§
žßÄŽį©žěźžĻėŽč®ž≤ī žāįŪēėÍłįÍīÄ žßĀžõźŽď§žĚÄ žßÄŽį©žĄ†ÍĪį Í≤įÍ≥ľžóź Žß§žöį ŽĮľÍįźŪēėŽč§. Žč®ž≤īžě•žĚī ŽįĒŽÄĆŽäĒ Í≤ÉžĚī Í≥ß Ž™®žÖĒžēľ Žź† ÍłįÍīÄžě•žĚė Ž¨ľÍįąžĚīŽ•ľ žĚėŽĮłŪēėÍłį ŽēĆŽ¨łžĚīŽč§. žĚėžā¨ ž∂úžč†žĚł ÍĻÄžėĀŪėł(52) ž†Ą ž≤≠ž£ľžĚėŽ£Ćžõźžě•žĚÄ 12žĚľ ‚ÄúžßÄŽį©žěźžĻėŽč®ž≤īÍįÄ ŽßąžĻė ž†ĄžüĀŪĄį ÍįôŽč§.‚ÄĚÍ≥† ŽßźŪĖąŽč§. Í∂ĆŽ†•žĚĄ žě°žĚÄ žÉą Žč®ž≤īžě•Í≥ľ Í∑ł žł°Í∑ľŽď§žĚī ž†źŽ†ĻÍĶįž≤ėŽüľ ŪĖČžĄłŪēėŽ©īžĄú žĚłžā¨Í∂ƞ̥ ŽßąÍĶ¨ ŪúėŽĎźŽ•īŽäĒ Í≤ɞ̥ ŽĻóŽĆĄ ŽßźžĚīŽč§.ÍĻÄ ž†Ą žõźžě•žĚÄ ž†ēžöįŪÉĚ ž†Ą žßÄžā¨ žě¨žěĄ žčúž†ąžĚł 2006ŽÖĄ 10žõĒ Í≥ĶŽ™®Ž•ľ ŪÜĶŪēī ž≤≠ž£ľžĚėŽ£Ćžõźžě•žóź žěĄŽ™ÖŽźźŽč§. ŽčĻžčú ž†ē ž†Ą žßÄžā¨ÍįÄ ŽįÄžĖīž£ľŽäĒ žā¨ŽěĆžĚī ŽĒįŽ°ú žěąžóąžßÄŽßĆ ÍįĎžěźÍłį Í≥ĶŽ™® Í≥ľž†ēžóźžĄú Í∑łÍįÄ Ž©īž†ĎžĚĄ ŪŹ¨ÍłįŪēėŽäĒ ŽįĒŽěĆžóź žĖīŽ∂ÄžßÄŽ¶¨ Í≤©žúľŽ°ú žĚėŽ£Ćžõźžě•žĚī ŽźźŽč§Í≥† ŪēúŽč§. Í∑łŽäĒ ž†ē ž†Ą žßÄžā¨žóźÍ≤Ć žĘčžĚÄ ž†źžąėŽ•ľ ŽįõžēĄ Ž≥īÍłį ŽďúŽ¨ľÍ≤Ć žóįžěĄžóź žĄĪÍ≥Ķ, 2012ŽÖĄ 10žõĒÍĻĆžßÄ žěĄÍłįŽ•ľ Ž≥īžě•ŽįõžēėžßÄŽßĆ žĚīŽč¨ žīąžóź ž†ĄÍ≤©ž†ĀžúľŽ°ú žā¨ŪĎúŽ•ľ Žćėž°ĆŽč§. žĚÄÍ∑ľŪēú žā¨Ūáī žēēŽįēžóź žěźž°īžč¨žĚī Ž™Ļžčú žÉĀŪēīžĄúŽĚľÍ≥† ŪĖąŽč§.
ž∂©Ž∂ĀŽŹĄžĚė žā¨Ūáī žēēŽįēžĚī žčúžěĎŽźú Í≤ÉžĚÄ žßÄŽāúŪēī 11žõĒ. žĚīžčúžĘÖ žßÄžā¨ÍįÄ ž∑®žěĄŪēú ŪõĄ 5ÍįúžõĒžĚī žßÄŽāėžĄúžėÄŽč§.
ÍĻÄ ž†Ą žõźžě•žĚÄ ‚ÄúŽčĻžčú ž†ēŽ¨īŽ∂ÄžßÄžā¨ÍįÄ žįĺžēĄžôÄžĄúŽäĒ ‚Äėž†ĄžěĄ žßÄžā¨ÍįÄ žěĄŽ™ÖŪēú žāįŪēėÍłįÍīĞ앎吏Ěī žä§žä§Ž°ú Ž¨ľŽü¨ŽāėžßÄ žēäžēĄžĄú ŽāīÍįÄ žĚī žßÄžā¨ žÜĆžÜćžĚł ŽĮľž£ľŽčĻ ž∂©Ž∂ĀŽŹĄŽčĻŪēúŪÖĆ ŪėľžĚī ŽāėÍ≥† žěąŽč§.‚ÄôŽ©į žöįŪöĆž†ĀžúľŽ°ú žā¨ŪáīŽ•ľ žĘÖžö©ŪĖąŽč§.‚ÄĚŽ©īžĄú ‚ÄúŽĮľž£ľŽčĻ ž™ĹžóźžĄú žĚėŽ£Ćžõźžě•žúľŽ°ú ŽāīŽ†§Ž≥īŽāľ žā¨ŽěĆžĚī žěąŽč§ŽäĒ ŽäźŽāƞ̥ ŽįõžēėŽč§.‚ÄĚÍ≥† ŽßźŪĖąŽč§.
žĚīŽēĆŽ∂ÄŪĄį ŽŹĄžĚė žēēŽįēžĚī Ž≥łÍ≤©ž†ĀžúľŽ°ú žčúžěĎŽźźŽč§. ÍĻÄ ž†Ą žõźžě•žĚī žßĄŪĖČ ž§ĎžĚł žĚėŽ£Ćžõź Ž¶¨Ž™®ŽćłŽßĀ Í≥Ķžā¨Ž•ľ ŽßąžĻėÍ≥† 8žõĒžóź žä§žä§Ž°ú Ž¨ľŽü¨ŽāėÍ≤†Žč§ŽäĒ ŽúĽžĚĄ ž†ĄŪĖąžßÄŽßĆ žč†žěĄ ž∂©Ž∂ĀŽŹĄ žł°žĚÄ ŽßČŽ¨īÍįÄŽāīžėÄŽč§. žĚī Í≥ľž†ēžóźžĄú ŽŹĄŽäĒ ‚ÄėÍįźžā¨‚ÄôŽ•ľ Ž¨īÍłįŽ°ú ÍĻÄ ž†Ą žõźžě•žĚĄ žēēŽįēŪēėÍłįŽŹĄ ŪĖąŽč§.
ÍĻÄ ž†Ą žõźžě•žĚÄ ‚Äú6žõĒÍĻĆžßÄ Ž¨īž°įÍĪī žā¨ŪĎúŽ•ľ žďįŽĚľŽäĒ ŽŹĄžĚė žöĒÍĶ¨Ž•ľ žąėžö©ŪēėžßÄ žēäžěź Íįźžā¨ÍīĞ觞󟞥ú žĚėŽ£Ćžõź Í≤ĹžėĀ žÉĀŪÉúžôÄ ÍīÄŽ†®Žźú ŽĮľÍįźŪēú žěźŽ£Ć ž†úž∂úžĚĄ žöĒÍĶ¨Ūēī žĚėŽ£Ćžõź žßĀžõźŽď§žĚī žúĄž∂ēŽźėÍłįŽŹĄ ŪĖąŽč§.‚ÄĚŽ©īžĄú ‚ÄúŽāīÍįÄ Ž¨ľŽü¨ŽāėžßÄ žēäžúľŽ©ī ÍįÄŽßĆŪěą žěąžßÄ žēäÍ≤†Žč§ŽäĒ ŽúĽžúľŽ°ú ŽįõžēĄŽď§žėÄŽč§.‚ÄĚÍ≥† ŪĖąŽč§.
žĚėŽ£Ćžõź Í≥†žú† žā¨žóÖžĚė ŽįúŽ™©žě°ÍłįŽŹĄ žĚīžĖīž°ĆŽč§. ž≤≠ž£ľžĚėŽ£ĆžõźžĚī ž∂ĒžßĄŪā§Ž°ú ŪĖąŽćė ‚ÄėžįĺžēĄÍįÄŽäĒ žāįŽ∂Ğ̳Í≥ľ žā¨žóÖ‚ÄôžĚī ÍįĎžěźÍłį žĚī žßÄžā¨ Í≥†ŽďĪŪēôÍĶź ŽŹôŽ¨łžĚī žõźžě•žúľŽ°ú žěąŽäĒ ž∂©ž£ľžĚėŽ£ĆžõźžúľŽ°ú ŽĄėžĖīÍįĒŽč§. žĚėŽ£ĆŪôėÍ≤ĹžĚī žóīžēÖŪēú ŽŹĄŽāī Ž∂ĀŽ∂ÄÍ∂ĆÍ≥ľ Žā®Ž∂ÄÍ∂Ć ŽÜćžīĆžßÄžó≠žĚĄ žąúŪöĆŪēėŽ©į žāįŽ∂Ğ̳Í≥ľ žßĄŽ£ĆŽ•ľ ŪēėŽäĒ žĚī žā¨žóÖžĚÄ ŽąĄÍįÄ ŽīźŽŹĄ ž∂©Ž∂ĀžĚė ž§Ďžč¨žóź žúĄžĻėŪēú ž≤≠ž£ľžĚėŽ£ĆžõźžĚī Žß°ŽäĒ Í≤Ć ŪÉÄŽčĻŪēú Í≤ÉžĚīžóąŽč§Í≥† ŪēúŽč§.
ÍĻÄ ž†Ą žõźžě•žĚĄ žēēŽįēŪēėÍłį žúĄŪēī Ūē† žąė žěąŽäĒ Í≤ÉžĚÄ Ž™®ŽĎź ŽŹôžõźŪēú žÖąžĚīŽč§.
ÍĻÄ ž†Ą žõźžě•žĚė ž§ĎŽŹĄ žā¨Ūáīžóź ŽĆÄŪēī žßĀžõźŽď§žĚī žēĄžČ¨žõĆŪē† ž†ēŽŹĄŽ°ú ÍĻÄ ž†Ą žõźžě•žĚÄ žßĀžõźŽď§žóźÍ≤Ć žč†Žß̞̥ žĖĽžóąŽč§. ŽßĆžĄĪž†Āžěźžóź ŪóąŽćēžĚīŽćė ž≤≠ž£ľžĚėŽ£ĆžõźžĚė Í≤ĹžėĀžĚĄ ŪĚϞ쟎°ú ŽŹĆŽ†§ŽÜ®Í≥†, Ž≥Ϟ觞̥ ŽĎź ŽįįŽ°ú Ūā§žöįŽäĒ ŽďĪ žĚėŽ£ĆžõźžĚĄ ŪôúžĄĪŪôĒžčúžľįŽč§. 200Ž™ÖžĚīŽćė žßĀžõźžĚĄ 4ŽÖĄŽßĆžóź 500Ž™ÖžúľŽ°ú ŽäėŽ†§ ž≤≠žôÄŽĆÄ Í≥†žö©ž†ĄŽěĶŪöĆžĚėžóźžĄú žěźžĻėŽč®ž≤ī žāįŪēėÍłįÍīÄžĚė žöįžąė žā¨Ž°ÄŽ°ú žÜĆÍįúŽźėÍłįŽŹĄ ŪĖąŽč§.
Í∑łŽäĒ ‚ÄúŽāīÍįÄ ž†ĄžěĄ žßÄžā¨žôÄ žĻúŽ∂Ą ÍīÄÍ≥ĄÍįÄ žěąŽäĒ Í≤ÉžĚÄ žā¨žč§žĚīžßÄŽßĆ žßÄŽāúŪēī žßÄŽį©žĄ†ÍĪį ŽēĆ ŪēúŽāėŽĚľŽčĻ žĄ†ÍĪįžöīŽŹôžĚĄ Ūēú Í≤ÉŽŹĄ žēĄŽčąÍ≥†, Ž≥Ďžõź Í≤ĹžėĀžÉĀŪÉúŽ•ľ žēÖŪôĒžčúŪā§žßÄŽŹĄ žēäžēėŽč§.‚ÄĚŽ©īžĄú ‚ÄúŽč®žąúŪěą ž†ĄžěĄžěź ŽēĆ žěĄŽ™ÖŽźú žā¨ŽěĆžĚīŽĚľÍ≥† žĚīŽüį žčĚžúľŽ°ú ŽāīžęďŽäĒ Í≤ÉžĚÄ žĚīŪēīŪē† žąė žóÜŽč§.‚ÄĚÍ≥† Ž™©žÜĆŽ¶¨Ž•ľ ŽÜížėÄŽč§. žĚīžĖī ‚ÄúŽĮľžĄ† 4ÍłįžôÄ ŽĮľžĄ† 5Íłį Ž™®ŽĎź ž£ľŽĮľŽď§žĚė ŽúĽžóź ŽĒįŽĚľ ž∂úŽ≤ĒŽźźŽäĒŽćį ž†ēžĻėŽÖľŽ¶¨Ž°ú žĚīŽ•ľ ÍĶ¨Ž∂ĄŪēī ŽĮľžĄ† 4ÍłįŽ•ľ Ž∂Äž†ēŪēėŽäĒ ŪĖČŪÉúŽäĒ žā¨ŽĚľž†łžēľ ŪēúŽč§.‚ÄĚŽ©īžĄú ‚Äúž†úžôēž†Ā žßÄŽį©žěźžĻėŽäĒ ž£ľŽĮľŽď§žĚī žßĄž†ē ŽįĒŽĚľŽäĒ Í≤Ć žēĄŽčąŽč§.‚ÄĚŽĚľÍ≥† žĚľžĻ®žĚĄ ÍįÄŪĖąŽč§.
ÍłÄ žā¨žßĄ ž≤≠ž£ľ Žā®žĚłžöįÍłįžěź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