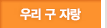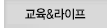м„ңмҡёмӢң к°„л¶Җмқё Sм”ЁлҠ” 28мқј м”Ғм“ён•ң н‘ңм •мңјлЎң мқҙл ҮкІҢ л§җн–ҲлӢӨ. к·ёлҠ” вҖңм§Ғмӣҗл“Өм—җкІҢ к№ҠмқҖ мқёмғҒмқ„ мӢ¬м–ҙм•ј н•ҳлҠ” л§ҲлӢ№м—җ м•„мү¬мҡҙ лҢҖлӘ©мқ„ л§җн•ҙмЈјлҠ” мһҘл©ҙмқҙм—ҲлӢӨ.вҖқкі лҚ§л¶ҷмҳҖлӢӨ. мӢңлҜјл“Өмқ„ кі к°қмңјлЎң лӘЁмӢңлҠ” кІғлҸ„ мӨ‘мҡ”н•ҳм§Җл§Ң, лЁјм Җ лӮҙл¶Җ кі к°қмқё м§Ғмӣҗл“Өкіјмқҳ мҠӨнӮЁмӢӯмқ„ лҠҳл Өм•ј н•ңлӢӨлҠ” м–ҳкё°лҘј н•ҳлҚҳ мӨ‘мқҙм—ҲлӢӨ. вҖңк·ёлҹ°лҚ° к·Җн–Ҙн•ҳлҠ” лІ„мҠӨ 40лҢҖм—җ мҠ№м°Ён•ң м§Ғмӣҗл“Өмқ„ лҢҖн•ҳлҠ” лӘЁмҠөмқҖ мҠӨнӮЁмӢӯкіј кұ°лҰ¬к°Җ л©Җм—ҲлӢӨ.вҖқл©ҙм„ң вҖңм•„л¬ҙлҰ¬ лӘЁмӢңлҠ” мһ…мһҘмқҙм§Җл§Ң мӮ¬м§„ м°Қмңјлҹ¬ лІ„мҠӨм—җм„ң лӮҙлҰ¬лқјл©ҙ лҲ„к°Җ лӮҳм„ңкІ лҠҗлғҗ.вҖқкі лҗҳл¬јм—ҲлӢӨ. кјӯ лІ„мҠӨм—җ мҳӨлҘҙм§ҖлҠ” м•ҠлҚ”лқјлҸ„ м°Ҫл¬ё мҳҶм—җм„ң вҖҳмһҳ лӢӨл…ҖмҳӨлқј.вҖҷлҠ” лң»мңјлЎң мҶҗмқҙлқјлҸ„ нқ”л“Өм—ҲлӢӨл©ҙ мӢңмһҘмқ„ лӢӨмӢң ліҙлҠ” кі„кё°к°Җ лҗҳм§Җ м•Ҡм•ҳкІ лҠҗлғҗлҠ” л§җмқҙлӢӨ.
лҳҗ лӢӨлҘё к°„л¶Җ Kм”ЁлҸ„ вҖңмӮ¬лІ•мӢңн—ҳмқ„ кұ°міҗ мҠӨнғҖ ліҖнҳёмӮ¬лЎң мқҙлҰ„мқ„ м•ҢлҰ¬кі , көӯнҡҢмқҳмӣҗ м„ кұ°лӮҳ мІ« м„ңмҡёмӢңмһҘ м„ кұ°лҘј мүҪкІҢ м№ҳлҹ¬м„ң мҠӨнғҖмқј кө¬кё°лҠ” н–үлҸҷмқ„ кәјлҰ¬лҠ” кІғ к°ҷлӢӨ.вҖқкі л§һмһҘкө¬лҘј міӨлӢӨ. к·ёлҠ” вҖңмІ« мһ„кё° л•җ к·ёл ҮлӢӨ м№ҳлҚ”лқјлҸ„ мқҙм ңлҠ” 진м§ң лӢ¬лқјм ём•ј н•ңлӢӨ.вҖқкі л§җн–ҲлӢӨ. вҖңм§Ғмӣҗл“ӨмЎ°м°Ё кІҪмӣҗмӢң(?)н•ҳлҠ” мҲҳмһҘ(йҰ–й•·)мқҙлқјл©ҙ 진м§ң 충м„ұ(?)н•ҳм§Җ м•Ҡмқ„ кІғвҖқмқҙлқјкі лҸ„ н–ҲлӢӨ. мӢңмқҳнҡҢлӮҳ мһҗм№ҳкө¬мІҳлҹј м—¬мҶҢм•јлҢҖмқё мғҒнҷ©м—җм„ң лӮңкөӯмқ„ мқҙкІЁлӮҙл Өл©ҙ лӘЁлІ”мғқ мҠӨнғҖмқјм—җм„ң лІ—м–ҙлӮҳлҠ” кІҢ л°”лһҢм§Ғн•ҳлӢӨлҠ” кІ°лЎ мқҙм—ҲлӢӨ.
мқҙм—җ лҢҖн•ҙ мқҙмў…нҳ„ м„ңмҡёмӢң лҢҖліҖмқёмқҖ вҖңмӢңмһҘк»ҳм„ң м—°нңҙ м „лӮ кі н–ҘмңјлЎң к°ҖлҠ” м§Ғмӣҗл“Өкіј мӮ¬м§„мқ„ м°ҚкІҢ лҗң кІғмқҖ л…ёмЎ° мёЎмқҙ н•Ёк»ҳ мӮ¬м§„ мҙ¬мҳҒмқ„ н•ҳмһҗкі л¶ҖнғҒн•ҙ мқҙлӨ„진 кІғмқҙлӢӨ.вҖқлқјкі н•ҙлӘ…н–ҲлӢӨ.
мҶЎн•ңмҲҳкё°мһҗ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