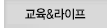빚더미 지자체 울며 복지 따라하기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회연설에서 “2014년까지 복지담당 공무원을 7000명 늘려 지역단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광주시 북구의 복지공무원 한 명이 6000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복지 온기가 현장에 제대로 확산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한 대책이었다.●“복지확대” 정치권·정부·국민 요구 외면 어려워
하지만 속사정은 복잡했다. 인원도 인원이지만 재정문제로 복지예산 확충이 쉽지 않아서다. 7000명 가운데 신규 채용하는 인원은 3340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행정직 공무원을 전환배치하기로 했다.
신규 인원은 전국 시·군·구별로 평균 14.5명. 정부는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지자체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통교부세로 해결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중앙정부 복지 예산이 끊임없이 늘다 보니 보조를 맞춰야 하는 지자체의 기초 체력이 고갈된 것이다. 결국 정부는, 서울시는 복지공무원 인건비의 50%, 그 외 지역은 30%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자치제 시행 20년이 지났지만 새로 뽑는 지방공무원 인건비의 상당액을 정부에 의존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지자체 예산 담당자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다. 빚과 세 부담이 늘어나는데도 정치권·정부의 방침과 국민요구를 외면할 수 없어 덩달아 복지를 외쳐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때문이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 복지 예산은 2007년 9937억원에서 올해 2조 3209억원으로 134%나 급증했다. 반면 총예산은 같은 기간 6조 8215억원에서 7조 9867억원으로 1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전체 예산에서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9%에 달한다.
또 시 누적 부채도 3조원에 바짝 근접해 큰 부담이다. 시는 “재정위기 관리시스템과 복지 평가 시스템을 운용해 부채가 3조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총·대선 후 불어닥칠 공약 열풍을 이겨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서울에서는 복지 확대 등에 따라 시민 한 명이 내는 세금(담세액)이 올해 처음으로 120만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시민에게 편성된 예산은 줄었다. 시민 한 명당 담세액은 2007년 87만 8000원에서 올해 122만 6000원으로 40%나 늘어났다.
시민 한 명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2007년 126만 4000원에서 2009년 167만원으로 올라갔다가 올해는 147만 4000원에 머물렀다. 경기도도 올해 전체 예산 15조 2642억원 가운데 복지예산(3조 8237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25%를 넘어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시·군의 지방세는 8종인 반면 자치구는 3종에 불과해 위기상황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기도선 전체 예산의 25% 차지
박인화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심의관은 “지금까지는 정부가 노인이 밀집해 있는 농촌지역에 지원을 집중해 왔지만 실제로는 빈민이 밀집한 도시 자치구가 수입은 적고 지출은 많아 재정이 열악한 곳이 더 많다.”면서 “지역 특성에 따른 예산 지원 및 지출 대책을 집중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