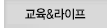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김모(49·광주시 농성동)씨가 지난 1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구속됐다는 보도(서울신문 11일자 6면)가 나간 뒤 해당 공무원 신원을 묻는 전화가 하루 수십통씩 걸려오고 있다.
논산경찰서 박민수 강력2팀장은 16일 “최근에는 뜸해졌지만 보도가 나간 다음날과 이튿날은 하루 종일 전화공세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자치단체와 관공서에 몸담고 있는 이들은 전화를 걸어 “우리 직원이 있느냐.” “우리 직원도 있다는데 누구냐.”는 등 질문을 퍼부었다. 경찰이 ‘사생활보호를 위해 절대 알려줄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일부는 수화기를 쉽게 내려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게 돈을 바친 행위가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지만 지자체나 기관에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주로 감사 관련 관계자의 전화가 많았다.
논산경찰서에는 또 부산, 광주 등 전국 기자들의 문의도 잇따랐다. 대개 자기지역에는 공무원이 누가 있는지 알아 기사화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
박 팀장은 “피해자들이 대부분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부정했지만 보도 직후 수사에는 더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면서 “범인검거에 공로가 큰 논산 모기관장에게 감사패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산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