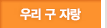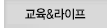‘뉘라 둥근달이 하늘 위에 있다 하느뇨. 취해보니 술 잔 밑에 분명히 가라앉아 있네. 잔을 기울이니 달 또한 내 창자 속에 드는구나. 안팎의 달빛이 서로 오가니 그 아니 좋을쏜가.’
둥근 보름달을 좋아하다 못해 이렇게 술잔 속에 넣어 마셔버리기까지 했던 겁니다. 달을 유난히도 좋아했던 ‘상진 정승’은 물론이고, 우리 선조들은 그 예전부터 ‘풍월’을 즐겨온 민족이잖아요.‘바람 풍(風)자’에 ‘달 월(月)자’. 옛사람들이 쓴 시에 보면 달을 읊은 시가 가장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선조들이 그만큼 달을 좋아했었다는 증거인 셈이죠.
우리 서울의 옛 지명 중에 ‘상정승골’이 어느 지역이었는지 아십니까. 현재 중구의 남창동, 북창동, 그리고 남대문로 3가, 태평로 2가에 걸쳐 있던 마을이 상정승골이었습니다.‘정승 상진’이 살던 집이 바로 그쪽에 있었기에. 그래서 ‘상동’이라고도 했고, 또 다른 말로는 ‘상정승골’이라고도 불러왔던 겁니다.
정승 상진에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창고가 너무 낡아 바람만 불면 허물어질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집 하인이 더 이상 놔둘 수 없으니 창고를 수리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청했을 때, 상진 정승은 ‘창고를 수리한들 그 안을 무엇으로 채우겠느냐. 창고를 고친다 해도 쓸 일이 없으니, 그냥 그대로 놔두도록 해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대범합니까. 그리고 또 조정에 나갈 때 입는 ‘조복’ 말고는 평생동안 비단옷을 입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아침 저녁 밥상에 반찬이 늘 두접시뿐이었다고 하잖아요. 만일 반찬이 두 접시 이상일 때는 “옛 어른들도 두가지 이상 반찬을 먹지 않았는데, 하물며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어찌 두가지 이상을 먹겠느냐.”라며 나머지 반찬 접시를 상 밑에 슬며시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내일 모레는 한가위. 그 한가위 보름달은 그 예전에 상진 정승이 바라보던 바로 그 보름달입니다. 상진 정승처럼 그 보름달을 술잔속에 넣어 마시면서 우리 선조들의 달빛같은 청빈 정신을 그리워해 보면 어떨까요.
2006-10-05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