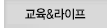‘벤처의 본산’임을 자처하는 인하대 벤처창업관에 입주해 있는 업체 직원들의 자조섞인 농담이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여겨졌던 벤처의 거품이 꺼지고, 경기침체까지 맞물려 “벤처를 계속해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 문을 연 벤처창업관은 입주비 및 관리비가 시중의 절반에 불과한 데다 인터넷, 사무기기, 컨설팅 등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때문에 초창기에는 IT·BT 업종 30개 기업이 4층 건물을 꽉 채웠으나 지난해부터 솔솔 빠져나가더니 지금은 19개만 남아 있다. 남은 기업들도 일거리 부족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서너개는 곧 문을 닫아야 할 처지다.
창업지원센터 소국천 매니저는 “가뜩이나 벤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자금이 부족해 힘없이 무너지곤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실은 벤처에 희망을 걸고 있는 재학생들에게도 위기감으로 다가서고 있다.
인하대 벤처 동아리 회원 조모(24·4학년)씨는 “아무리 아이템이 좋고 연구개발 능력이 뛰어나도 자금조달이 어렵다.”면서 “벤처사업에 계속 뜻을 두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날이 높아져 가는 취업 문턱 때문에 대학생에게 벤처 창업은 그래도 마지막 희망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서 6개월 근무하다 그만둔 박모(28)씨는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와 넉넉지 못한 월급에서 오는 자괴감으로 사표를 냈다.”며 “차라리 힘들더라도 자기 사업을 하는 편이 낫다는 생각에 벤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